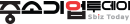박경만 객원 편집위원(한서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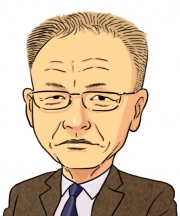
나라 안팎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라인’을 일본이 거저 먹으려고 한 것이다. ‘거저 먹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네이버의 기술력없인 애초 불가능했던 사업을 돈 몇푼으로 ‘꿀꺽’하려는게 바로 그런 심보 아닌가. 임진왜란 당시 도자기 장인과 기술을 강탈당한 일까지 소환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도, 네이버도 제대로 대응은커녕 눈치만 보고 있다. 민심이 성화를 부리니 마지못해 일본정부를 상대하는게 아니라 “네이버와 소통”한다고 했다. 심지어는 “반일 여론 선동”이라고 되레 자국민을 나무란다. ‘한국 정부’가 맞나 싶은 행정부와 집권층의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일은 일본이 아예 ‘라인’의 경영권을 내놓으라는게 핵심이다. 돈 줄테니 일궈놓은 재산 다 내놓고, 몸만 빠져나가란 얘기다. 허나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굴지의 소셜미디어로 키워놓은 노하우와 기술을 ‘IT후발국’ 일본에 몽땅 갖다바치게 생긴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인감과 도장, 팩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디지털자산보단 레거시 화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그런 곳에 네이버의 현란한 네트워크 기술이 심겨진 것이다. 애초 라인 사용자들마저 80% 이상이 블록체인이 뭔지도 몰랐다. 그런 일본인들에게 라인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맛보게했고, iOS와 안드로이드를 넘나드는 디바이스 매뉴얼도 가르쳤다. 생소한 ‘하이퍼클로바’ 광고와 이커머스로 그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했고, NFT용 디지털 지갑 ‘라인 비트맥스 월렛’으로 새롭게 돈버는 맛을 보게도 했다. 라인은 단순한 메시징 앱 이상이었다. 촌스럽던 일본의 디지털 문화가 신천지에 눈을 뜨게한, 에코시스템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라인은 계정 활성화 수준만 보면 페북이나 인스타, X, 틱톡 못지않다. 매월 2억명의 월간활성이용자(MAU)에다 아시아권 가입자만 10억명이 넘는다. 라인 서버가 수신하는 초당 메시징 리퀘스트만 40만 건이고, 공식 계정(OA)을 비롯한 각종 채널 수도 250만 개를 헤아린다. 사용자끼리 연결하는 노드링크도 무려 700억 개가 넘어 그야말로 범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루 오르내리는 사진, 동영상 용량만 11페타바이트(PB)에 달한다. ‘라인 경제’야말로 일본 디지털 경제의 동력이 된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일본은 안면몰수하며 자국 이익에 충실하고 있다. 이번 일의 중심에 선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사실도 한낱 가십거리일 뿐이다. 정작 정색해야 할 대목은 국제사회 현실이다. 국가 간에는 원초적 신의나 신사협정 따윈 통하지 않는다. 세계를 당위론의 텍스트로 본 식자들은 ‘세계를 다르게 독해’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질서를 순리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텍스트 바깥에 있는 언어, 곧 ‘힘(Power)’을 그들은 간과했다. 물론 힘에 의한 본능을 극복한 ‘협력’이 칭송을 받기도 한다. 국제질서를 그렇게 윤리적 틀에 맞춰 재구성하려는 노력도 의미는 있다. 그러나 그런 윤리적 구성주의의 괄호를 제거하는 순간, ‘힘=정의’라는 등식만이 남는다. 일본의 야비한 처사도 결국은 그런 등식에 충실한 결과값이다.
정작 문제는 우리 정부와 네이버 자신이다. 일정한 세력균형을 통해 안정이 획득되는 것이 국제관계의 공식이다. 막연히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며, ‘입 속의 혀’처럼 굽신거리다간 속된 말로 ‘뒤통수’ 맞기 십상이다. ‘라인사태’를 빚은 지금의 한일관계가 그 모양이다. 과기정통부의 코멘트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체 뭔 말인가? 말이 되는 듯 안되는 듯하다. 매각이 아님에도 괜히 우리가 ‘압박’으로 인식하는게 유감이란 뜻인가. 그런 알쏭달쏭 말장난을 외교적 수사랍시고 내놓는게 지금의 한국 정부다. 후일 크게 문제삼아야 할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네이버 역시 양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 몸만 사리고 있다. 그러다가 경영권을 빼앗기면 그 또한 배임행위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IT산업의 고객이자 사용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지금 형세로 봐선 그렇게라도 해야할 판이다. 일본의 반자본주의적 처사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도 비슷한 처지에 몰릴 수 있음을 만방에 고지할 수도 있다.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때와는 물론 세상이 다르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통로는 다양하다. 으름장에 불과할지언정, 국내 일본기업도 유사시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네이버가 용기를 내어 ISDS(투자자-국가소송) 제도를 이용하면 더 좋다. 다만 꼭 물어볼게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정부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