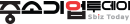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지역 주도 생태계 구축
‘우수 특구’는 고도화, ‘부진 특구’는 단계적 구조조정
...특구 제도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바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부가가치 고도화형' 예시. [중기부]](https://cdn.sbiztoday.kr/news/photo/202511/24980_27337_654.jpg)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20년 만에 특구 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청사진으로, 지역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성장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위기를 맞은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가 지역 브랜드 강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민간 참여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 규모·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
특화특구는 앞으로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 협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예컨대 ‘공주 알밤특구’처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클러스터를 모델화한다.
융합 혁신형은 문화재, ICT, AR·VR 등 신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지자체 요청 시 개별 인정특례나 기존 규제 한도 확대를 허용해 혁신 실험의 장으로 만든다.
도전 도약형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직접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과 중심 ‘신상필벌’ 체계로 경쟁력 제고
정부는 성과평가 등급제를 5단계로 세분화해 ‘우수·탁월’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특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지방중기청이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성과 중심의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 주체로 나서는 ‘진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특화특구 지정 시 최대 10년의 지정기간을 명시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또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고, 유사 특구 간에는 공동 프로젝트와 네트워킹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먹거리를 발굴·육성하는 자생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우수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3자 연계 구조를 통해 지역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