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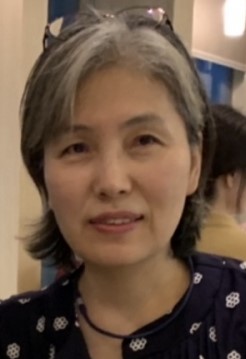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인연이었던 나의 어머니. 내 나이만큼의 기억이 있고, 이국에서 33년을 지탱시켜 준 절대우군이었던 어머니가 새해를 넘기지 못하고 작년 12월 중순 소천하셨다.
작년 여름부터 계속된 밤낮을 잊게 만든 업무와 각종 국제학술 연구발표, 그리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과 결국 연말에 어머니 상을 당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정신없이 오갔다.
발인을 끝내고 도쿄로 돌아왔을 때 이미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끼니때가 되면 학교 근처를 전전하기 일쑤였고 밖에서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집 냉장고를 뒤지기를 반복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심이 너무 컸기에 입맛을 벌써 잃어버렸고 잇따른 강행군에 피로는 축적돼 몸에서도 미열이 났다. 이렇다보니 마음도, 몸도 자연스레 한국 음식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음식판매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모두 휴무였다. 참다못해 인근 수퍼마켓을 돌며 각종 김치를 종류별로 구입했다. 한국서 수입한 김치, 일본서 제조한 김치 등 각양각색의 김치가 그럴싸한 홍보문구를 붙여놓고 있었다.
오랜만에 집밥을 즐기려고 일단 3 종류의 김치를 열어 맛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헉, 무슨 김치 맛이 이렇게 미끈거리고 걸죽하지? 다시마와 가츠오엑기스, 그리고 감미료와 사과즙에 고춧가루, 젤라틴을 부어 놓았나?’ 분명 예전에도 먹었던 맛인데, 이렇게 말초신경에서부터 저항감까지는 못 느껴왔다.
아마도 최근 한국을 오가며 남도의 광주, 순천 낙안읍성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맛 봤고, 지난달 전남대에서 열린 ‘2018 동북아평화교육 포럼’ 특강 뒤 영암 월출산 아래서 먹었던 김장김치로 심신이 회복됨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지금의 ‘끈적끈적, 미끌미끌, 걸죽한 맛’을 좋아하는 일본인 입맛에 맞춘 김치 맛에 필자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김치는 발효식품이다. 아삭아삭거리는 김치 배추 맛과 무맛 등의 식감이 좋아야 한다. 태양초로 붉디 붉은 색을 내면서도 다양한 양념으로 숙성된 감칠맛을 내는 김치는 결코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다.
맵고 짠 짠지나 장아찌도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김치란 밥과 함께하는 세끼 식사에서 제 1순위 반찬이란 위치에 있으니 거부감 있는 맛이 되어선 안 된다. 극단적인 예지만, 위장병을 앓는 필자도 제대로 된 김치를 먹고 나면 도리어 소화력이 좋아질 정도니, 김치란 각종 영양소가 조화를 이뤄서 빚어낸 인류 최고의 유산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다.
필자가 일본 유학을 시작한 80년대 교토의 수퍼마켓은 한국 음식이 전무했고, 이탈리아 음식재인 애호박으로 겨우 된장찌개를 해 먹었을 정도였다. 당시 민주화운동 시기였던 한국에서 전해오는 최루탄이 난무하는 뉴스가 나오면, 슬픈 내 나라 상황에 눈물이 넘쳐흘렀다.
이러던 차에 1987년 제38회 NHK 코우하쿠우타갓센(홍백가합전, 紅白歌合戦)에 한국인 최초로 가수 조용필씨가 ‘창밖의 여자’를 불렀다. 이를 보고 일본 중년 여성들은 “왜 하필이면 조선인이냐”고 핀잔을 했다. 이에 필자는 “조용필은 세계 수퍼스타다. 일본에 알려진 건 너무 늦은 정도”라며 고함을 치면서 “내가 잘 해야 내 조국이 욕을 안 듣겠다”는 묘한 애국심도 일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버거운 타향살이를 버텨왔다. 몇 번이고 귀국을 생각했지만, 3남1녀의 장녀로서 내가 선택한 길에서 나만의 학문적 토대를 완성하고 싶었다.
그런 옹고집으로 묵묵하게 연구에 매진하자 주변 교수님들과 지인들이 어느새 나를 이끌어 주기 시작했다. 그때 느낀 것은,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적잖은 눈물의 희생도 있었지만, 인고의 시간을 통한 자기 성찰과 이러한 과정의 필요성도 깨달았다.
박사논문 집필 때 목에 깁스를 해야할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6개월의 재활기간 동안, 자기혐오에 빠져 ‘부모님 곁을 떠나 불효하다. 일본서 죽겠다’는 실의에 빠져 유서를 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교수님들과 동료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구입해 아파트 문 앞에다 걸어 놓고 가는 등 필자의 건강을 챙겨줬다. 목발을 짚고 다닐 즈음에는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챙겨 오셔서 딸의 재기를 위한 손발이 되어 주셨다. 교토 하라다니에서 보낸 박사시절은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잔인한 시기였지만, 따스한 사람들의 온정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곳이기도 했다.
인생 마지막이라고 느꼈던 벼랑 끝에는 언제나 당신의 딸을 믿고 격려해 주신 든든한 어머니가 계셨고, 무조건 사랑으로 대해 주신 아버지도 계셨다. 그런 두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신 지금, 더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필자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마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김장철 기억이고, ‘미끌, 걸죽한’ 맛의 일본 수퍼마켓 김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맛깔난 어머니의 김치 맛’이다. <본지 제29호 12면 게재>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