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만 객원 편집위원(한서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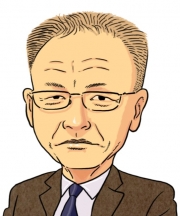
모였다 하면 요즘 ‘챗GPT’가 화제다. ‘AI’란걸 귓결로만 들어봤던 장삼이사들도 즐겨 입에 올릴 정도다. 좀 과장된 세태이겠거니 싶지만, 그 기술적 모티브를 알고보면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초대형AI로 개발한 GPT-3를 내장한 ‘챗GPT’는 한 마디로 인공지능 너머 인간지능을 넘본 것이다. 인간과 흡사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고 해서가 아니다. 인간세상의 작동 기술, 곧 ‘생성’(Generative)의 기원을 ‘임베디드’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서양문명에서 특히 두드러지지만, 20세기 들어 생성은 존재보다 현격한 우위에 섰다. 그 결과 현존재를 부정한 전대미문의 변혁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열린 생성적 판도라의 상자는 21세기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문명을 열어제쳤다.
GAN으로 워밍업하며 등장한 GPT-3, 그리고 챗(Chat)GPT는 단순히 모방이나 기계학습과 같은 존재의 기술이 아닌, 생성과 창조를 욕망한 도발이라고 하겠다. 첫머리 글자 ‘G’가 곧 ‘Generative’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게 보면 이를 만든 오픈AI나, 뒷돈을 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못 발칙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디지털기술과 생성의 조합은 활을 떠난 활시위마냥 인간의 경지를 과녁삼아 날아가고 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AI의 위력은 익히 알려진대로다. 명령어 하나면 인생상담도 하고, 화가 뺨치는 그림이나 빼어난 칼럼도 써내고, 웬만한 논문 초안 정도는 어렵잖게 그려준다. 복잡한 연산이나 웹코딩, 자연어 풀이 정도는 식은 죽먹기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술적 함의가 있다. 학습과 테스팅 과정 자체가 ‘인간’의 재현이며,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생성과 창조의 모티브를 그대로 베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트랜스포머로서 GPT의 자기회귀적 언어 모델이 그렇고, 그에 앞선 생성적 대립 신경망 GAN도 그러하다. 생성모델이 내민 가짜 데이터를 판별모델이 반박하고, 다시 처음보단 좀더 사실에 근거한 모델로 수렴해가는 모습은 인간사회의 원리를 본딴 것이리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늘 같고 다름의 길항(拮抗․conflict)과 변증으로 점철되는 질서를 커닝한 것이다.
GPT 역시 그 대표적인 아류다. 제로샷, 원샷, 퓨샷(few-shot)러닝에 이르는 시행착오와 훈련, 반면교사의 검증이 반복된 결과물이다. 데이터 세트를 훈련하기 위한 서포트 데이터와, 테스트를 위한 쿼리(Query) 데이터의 대치도 이를 웅변한다. 아젠다 설정과 대립의 갈등 구조를 연상케하며, 좀 거창하게는 정(正)과 반(反)이 혼재된 인간 존재의 모순율, 그것까지 성찰했다고나 할까. 실제로 그 토대가 된 초대형AI의 개발자들이 그런 걸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파생된 것들로 멀티모달이 나왔고, ‘달리(DALL-E)2’도 등장하며, 생성AI의 극치를 선보이고 있다.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온갖 것들을 창작하는 모델리티의 작법들은 그렇게 초대형 인공지능의 기초가 된 것이다.
생성AI의 무한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픈AI가 4월경에 내놓을 GPT-4는 매개변수가 무려 100조나 된다고 하니, 인간의 두뇌보다 못할 게 없다. 얼마 안가 그걸 뛰어넘는 무엇이 또 나올 것이다. 이미 구글도 GPT-3.5쯤은 되어보이는 ‘바드AI’를 개발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니, LG 엑사원이니, 카카오 코GPT니 하는 것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대차도 나름대로 ‘달리e’ 기술을 선보였다. 웬만한 딥페이크나 머신러닝은 이젠 한 물간 레거시 기술로 치부될 판이다. 양자기술과 함께 초대형 생성AI는 그처럼 디지털 문명의 앞날에 어떤 반전이 올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묻게 된다.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좋든 싫든 실재하는 기술을 선형적으로 흡입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적 소유를 할 것인가. 섣불리 해법을 말하긴 어렵다. 굳이 한 가지 제안하자면, 당위와 대립이 변증하는 학습데이터의 파라미터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이 1750억개가 되든 1조, 10조, 100조가 되든, 매개변수로서 갖는 이치는 하나다. 곧 모순된 긴장 관계, 곧 창조적 부딪힘의 지혜이며, 예측 불가한 무한 상상소의 카오스적 변형이 그것이다. 초대형 생성AI, 그 후의 기술 국면에 대처하는 열쇳말도 그 속에 담겨있다.
그래서다. 두려워하지도, 낙관하지도, 섣부르게 결론지을 필요는 없다. “4차산업혁명’은 이런 것”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 ‘AI에 일자리와, 인간의 설 자리를 빼앗길까’ 따위의 경계심도 철지난 것이다. 애초 생성AI 자체가 인간만의 창조적 생성능력에서 나온게 아니던가. 그렇다면 또 다른 인간문명을 생성하기 위해 생성AI를 어떻게 부려먹을 것인가. 어차피 인간의 생성원리를 학습(pre-trained)한 트랜스모머일진대, 이를 유능한 기술도구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궁리하는게 낫다. 궁색하지만 현재로선 그게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