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만 본지 편집위원
한서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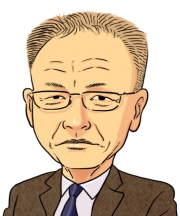
[중소기업투데이 박경만 편집위원] 지난해던가. 문화체육부의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3분의 2가 “삶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인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반가운 일이었다. 무릇 경제․사회를 구동하는 배분적 평등과 공정한 질서 또한 그런 성찰이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아 그러했다. 걸핏하면 그런 질서를 훼손하는 이 땅의 현실에 견줘볼 때 그런 생각들이 더욱 반가웠다.
기실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인 갑질과 차별, 독점, 고질적 시장 왜곡은 여전하고, 양극화와 빈부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게 현실이다. ‘땅따먹기’ 식의 부동산 시장은 사회적 갈등과 계급 모순을 날로 부추기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차적으론 정책 담당자와 위정자들 탓이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두를 해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네 삶의 문법에 대한 대중적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문해보는게 더 솔직할 것이다.
그래서다. 4차산업혁명 운운하는 지금, 그 옛날 헨리 조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지는 “왜 만인의 것(토지)을 특정인이 독점하는가”란 원초적 질문에서부터 사유를 시작한다. 굳이 21세기 버전으로 바꾼다면 그의 ‘토지’는 곧 부(富)를 낳는 생산수단 일체다. 애초 조물주에 의해 한정지어진 생산수단 내지 토지로부터 재화 일반이 산출된다. 그래서 공유되어 마땅한 원초적 생산수단에서 나온 지대는 공유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물론 토지 공유나 단일토지세를 내건 조지의 사유는 현대 이익사회의 담론과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던진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굳이 번역하자면 약자에게 사회적 가중치를 얹어주는 ‘차등한 평등’이라고나 할까. 오늘의 산업사회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하긴 후학자인 존 롤즈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밀림의 법칙을 유발하는 무한 자유주의보단, ‘자유주의적 평등’으로 화답했다. 곧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배분을 위한 정당한 차별을 말했다. 마침내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공동체의 최약자에게 사회적 자산의 최대 분량이 주어지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찬미했다. 이를 확장하면 공동체적 소산이라고 할 산업적 부가가치나 토지거래 차익 또한 공공의 지대로서 공평무사하게 사용되고, 공정하게 향유되는게 이상적이다.
<지대론>의 데이비드 리카도 역시 그런 현실을 꿈꾸었다. 리카도는 그러나 인구증가나 기술 발전의 열매가 토지(자산)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흡수되고, 빈부 격차가 커지며 지대가 상승하고 임금은 하락하는 현실을 탄식했다.
사실 인류사를 통털어 보면, 절대적인 사적 소유권은 ‘연식’이 그리 오래지 않다. 독점적 부를 삶의 목표로 삼은 근대 상업국가 이후를 제외하면, 이는 통례라기보단 역사적 예외에 속한다. 하긴 ‘사유’(私有, private)의 어원이 라틴어 ‘privare’(빼앗다)가 아니던가. 타인이 사용하거나 즐길 권리를 빼앗는 것이란 뜻이다. 인간으로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단, 그 수단으로서 약탈적 점유와 쾌락을 추구한다는게 그것의 함의다.
실제 디지털혁명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그런 징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슈퍼리치’는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먼저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를 작동시켜 억만금의 소득을 취한다. 반면에 99%의 사람들은 ‘긱’ 경제에 매달려 평균 이하 소득으로 연명하게 된다. 소수가 과도한 보수를 받는 멱 법칙이나, 비정상의 파레토 곡선이 적나라하게 광폭의 그물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차 디지털 세상에서도 유통될 배분적 정의의 공식이 보인다. 21세기에 펼쳐질 공유경제의 진정한 ‘공유’를 모색하고, 존재보단 소유에 목을 매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게 그것이다. ‘세상을 독점하려 발버둥 치는 자,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欲取天下而爲之, 不得已)’고 한 노자의 성찰도 되돌아볼 일이다. 모두가 평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되, 경제와 사회적 과정에서 돌출하는 모든 인간 소외를 이젠 소외시켜야 한다. 제로섬의 머니게임과, 돈놓고 돈먹는 비(非)자본주의적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소외시켜야 마땅하다.
그건 곧 합성생물학과 디지털물리학, 나노공학의 21세기가 오히려 사모해야 할 코이노니아의 태도라고 하겠다. 앞서 “삶의 가치를 성찰케 하는 ‘인문’이 중요하다”는 설문 응답이 대중적 깨달음으로 승격되기 위한 방법도 된다. 공학적 세계관이 지배할 디지털 세상에서 구태여 헨리 조지를 소환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디지털 버전 인문정신의 한 갈래를 그에게서 채굴하기 위한 것이다.

